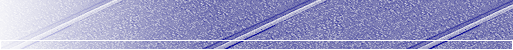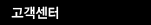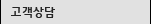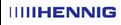<script type="text/javascript">
$('body').on('click', '#mw_basic .document_address_copy', function(){
var document_address_input = $('#document_address_hidden');
// 먼저 해당 input의 type을 text로 만들어야 함
document_address_input.prop('type', 'text');
document_address_input.select();
var copy = document.execCommand('copy');
document_address_input.prop('type', 'hidden');
if(copy){
alert('클립보드에 복사되었습니다');
}
});
</script>
세리나 윌리엄스-로저 페더러 나란히 은퇴
‘흑인 여성’ 새 역사 쓴 윌리엄스
‘스타들의 스타’ 로저 페더러

테니스 팬들에게 ‘9월은 잔인한 달’이다. 지난달 3일 ‘테니스 여제’ 세리나 윌리엄스(41·미국)가 US오픈 테니스 대회 3회전에서 ‘라스트 댄스’를 마친 데 이어 3주 뒤에는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41·스위스)도 레이버컵에서 코트와의 이별을 알렸기 때문이다.
윌리엄스와 페더러 모두 4대 메이저 대회(호주오픈, 프랑스오픈, 윔블던, US오픈) 남녀 단식 최다 우승자는 아니다. 윌리엄스는 프로 선수가 메이저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된 1968년 이후(오픈 시대) 여자 단식 최다(23회) 우승 기록을 남겼지만 역대 기록으로 따지면 마거릿 코트(80·호주·24회)에 이어 2위다. 페더러의 메이저 대회 우승(20회) 역시 라파엘 나달(36·스페인·22회), 노바크 조코비치(35·세르비아·21회)에게 뒤진다.
그런데도 윌리엄스가 여자 테니스 역사상 ‘GOAT(the Greatest of All Time)’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역대 최다 우승 주인공 코트밖에 없다. 페더러 팬들은 페더러를 나달, 조코비치와 함께 ‘남자 테니스 빅 3’로 묶는 데도 거부감이 있다. 페더러가 더 높은 레벨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 파괴적 창조자 윌리엄스
윌리엄스는 1999년 US오픈에서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챔피언이 됐다. 오픈 시대 들어 흑인 여자 선수가 메이저 대회 단식 정상을 차지한 건 윌리엄스가 처음이었다. 이 대회부터 2003년 US오픈 사이에 열린 17차례 메이저 대회 가운데 6번은 윌리엄스, 4번은 한 살 터울 언니 비너스 윌리엄스(42)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 중 6번은 윌리엄스 자매끼리 결승에서 맞붙었다.
그러면서 백인 일색이던 테니스 코트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라트리스 마틴 루이지애나주립대 교수(스포츠사회학)는 “어릴 때부터 윌리엄스 자매가 보여준 자신감과 기술, 재능, 열정은 흑인들이 이들을 응원하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만들었다”면서 “윌리엄스 자매의 존재는 미국 사회가 흑인을, 또 흑인 스스로가 흑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올해 프랑스오픈 여자 단식 준우승자 코코 고프(18·미국)는 US오픈 기간 “어린 시절 광고 촬영 때 (세리나) 윌리엄스의 대역을 맡은 적이 있었다”면서 “한 번도 내가 (흑인이라) 다르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나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그게 윌리엄스 자매에게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고 말했다.
동생 세리나는 2002년 프랑스오픈, 윔블던, US오픈 결승에서 언니를 연달아 물리치면서 여제로 등극했다. 세리나를 권좌로 이끈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서브였다. 세리나는 마흔 살이던 지난해 호주오픈 때도 서브 최고 시속 202km를 기록했다. 이 대회에 참가한 남자 선수 128명 중 52명보다 빠른 기록이었다.
US오픈 경기장 ‘빌리진 킹 국립 테니스센터’에 이름을 남긴 여자 테니스의 전설 빌리진 킹(79)은 “세리나는 여자 테니스 경기 양상을 바꿨다. 몇 점을 뒤지고 있든 서브 연속 에이스로 동점을 만들 줄 아는 선수였다. 세리나의 서브가 강해질수록 이에 대응해 상대 선수의 기량도 올라갔다”고 말했다.
○ 라켓을 든 아티스트 페더러
윌리엄스가 테니스 코트에 없던 걸 만든 인물이라면 페더러는 테니스 본연의 미(美)를 극대화한 선수였다. 페더러 이전에 ‘테니스 황제’로 불리던 피트 샘프러스(51·미국)와 페더러를 모두 지도한 폴 아나코네 코치(59)는 “페더러는 테니스를 참 쉬워 보이게 만들었다”고 했다. 페더러는 전혀 힘든 기색 없이 상대 코트 깊숙한 곳에 포핸드 위너를 날리고 우아한 한 손 백핸드 스윙으로 상대 선수를 제자리에 얼어붙게 만드는 일이 아무렇지 않던 선수였다.
주니어 시절까지 테니스 선수로 뛰었던 미국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 ‘종교적 체험으로서의 로저 페더러’라는 칼럼을 썼다. 그는 이 글을 통해 “페더러의 경기를 집에서 볼 때면 턱이 벌어지고 눈이 튀어나왔다. 페더러가 강림한 것이다. 테니스를 좀 쳐 본 사람이라면 페더러가 불가능에 가까운 플레이를 또 한 번 쉽사리 해냈다는 걸 눈치 챌 수 있었다. 그래서 충격이 더욱 컸다”고 했다.
페더러에게 매료당한 건 월리스뿐만이 아니었다. 페더러는 남자프로테니스(ATP)투어가 진행하는 투표에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9년 연속으로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1위에 올랐다. 프로 스포츠에서 인기는 곧 돈이다. 페더러는 무릎 부상으로 지난해 윔블던 이후 올해 레이버컵 전까지 대회에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지만 테니스 선수 수입 랭킹에서는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페더러는 ‘스타들의 스타’이기도 했다. 페더러가 코트에 모습을 드러내면 경기장 라커룸은 텅 비기 일쑤였다. 선수들이 페더러의 경기를 보려고 관중석이나 TV 앞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테니스 명예의 전당 회원인 클리프 드라이스데일(82·남아프리카공화국) ESPN 해설위원은 “1960년대에 테니스를 지배했던 로드 레이버(84·호주) 이후 이런 광경은 처음 봤다”며 “팬들에게 사랑받는 것과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말했다.
○ 투사와 순정남의 공통점
윌리엄스는 ‘투사’였다. 선수 생활 내내 마리야 샤라포바(35·러시아)와 ‘디스’를 주고받았고, 2019년 US오픈 결승 때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린 주심에게 “당신 같은 심판은 앞으로 내 경기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면서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 이제는 “딸 올림피아(5)가 동생을 원한다”면서 은퇴를 선택한 다정한 엄마이지만 결혼 전에는 동료 테니스 선수부터 할리우드 배우에 이르기까지 염문도 숱하게 뿌렸다.
페더러는 선수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사건 사고’로 언론에 이름이 오른 적이 없다. 오히려 ‘로저 페더러 재단’을 통해 자선 구호 활동을 벌이면서 미담을 제조하기 바빴다. 또 그가 라이벌인 나달이나 조코비치를 칭찬했다는 외신 기사에는 ‘진심 어린’, ‘질투를 모르는’ 같은 표현이 빼놓지 않고 등장한다. 페더러는 스위스 테니스 대표팀 동료였던 미르카 바브리네츠(44)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교제를 시작해 2009년 결혼에 골인한 ‘순정남’이기도 하다.
이렇게 캐릭터는 서로 다르지만 두 선수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페더러는 나달보다는 다섯 살, 조코비치보다는 여섯 살이 많지만 라이벌로 통한 반면 페더러보다 다섯 살 많은 카를로스 모야(46·스페인)는 ‘옛날 선수’ 느낌이 난다. 역시 옛날 선수 느낌이 강한 마르티나 힝기스(42·스위스)도 윌리엄스보다 한 살이 많을 뿐이다.
21세기 테니스는 윌리엄스와 페더러가 옛날 선수들을 물리치고 여제와 황제에 오른 뒤 새로운 세대가 이들에게 도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넘나든다. 미국공영라디오(NPR)에서 “윌리엄스와 페더러가 테니스를 영원히 바꿔 놓았다”고 과거형 문장을 쓰는 사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둘이 은퇴한 테니스는 예전과 결코 똑같지 못할 것”이라고 미래를 이야기한 이유다.
기사제공
동아일보
임보미 기자 [email protected]